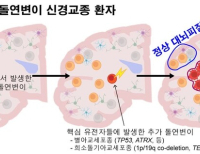김진수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사팀이 동물실험을 통해 나노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보다 파킨슨병과 유사한 뇌 손상 및 신경 염증을 현저히 더 유발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고 24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앞서 나노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보다 뇌에 더 쉽게 축적된다는 사실을 규명한 데 이어, 이번엔 나노플라스틱이 파킨슨병을 어떻게 발병시키는지 규명했다.
연구팀은 합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스티렌을 직경 250나노미터(nm) 미세플라스틱과 이보다 12.5분의 1 수준으로 작은 20나노미터(nm) 나노플라스틱 형태로 준비하고, 방사성동위원소 구리-64를 표지하여 실험쥐 기도에 투여한 뒤,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해 뇌 속 플라스틱의 축적 위치와 양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파킨슨병과 관련된 대뇌 내부의 선조체(도파민 신호를 받아 몸의 움직임 조절)와 중뇌 흑질(도파민 분비 신경세포가 분포함)에서 나노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보다 2~3배 더 많이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질의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선조체로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움직임이 느려지고 근력이 약해지는 파킨슨병이 나타나게 된다.
이어 미세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을 각각 하루 20마이크로그램(µg)씩 16주간 에어로졸 형태로 실험 쥐에게 흡입시키며 운동·행동 변화, 염증 발생 및 유전자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운동 능력 면에서 나노플라스틱 노출 쥐는 미세플라스틱 노출군에 비해 로타로드 회전봉 검사에서 체류 시간과 악력이 약 38.5% 감소했으며, 트레드밀 검사에서는 피로 도달 시간이 약 39.6% 줄어 파킨슨병과 유사한 운동장애를 보였다.
행동 양태 면에서 탐색 행동 감소와 함께 불안 증상이 2배, 우울증 경향이 1.5배 증가하는 등 비운동 증상도 나타났다.
뇌 조직 분석 결과, 염증 면에서 나노플라스틱은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을 1.4배, 파킨슨병의 핵심 단백질인 인산화 알파시누클레인 축적을 1.9배 높였다. 알파시누클레인은 뇌 신경세포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는 인산화 형태로 뭉쳐서 신경세포 안에 축적되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도파민 신경세포(도파민 분비 세포가 아닌 도파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신경세포) 사멸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별세포와 미세아교세포 활성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1.8~3배 상승하여 뇌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세포는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미세아교세포는 뇌 속 병원체나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 하지만 이들 세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돼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유전자 RNA 시퀀싱 분석 결과, 선조체와 흑질에서 Kcnn4, Tlr7 유전자의 증가와 Neurod1, Cartpt 유전자의 감소 등 파킨슨병 환자와 유사한 유전자 변화가 확인됐다. Kcnn4은 미세아교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를 통해 만성 신경염증과 도파민 신경세포의 점진적 손실을 초래한다. Tlr7은 세포 손상과 병원균 침입을 감지하는 선천 면역 수용체로서 만성적으로 활성화되면 지속적인 신경 염증 및 변성을 초래한다. Neurod1, Cartpt 등은 염증 조절, 신경 보호 등 다양한 생물학적 경로에 관여한다.
이번 연구로 연구팀은 나노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보다 뇌 침투력이 높고, 도파민 신경 및 뇌 염증을 악화시켜 파킨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유해물질 연구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Advances)’ 2025년 11월 13일자 온라인판에 ‘Nanoplastics Cause an Increased Risk of Parkinson’s Disease Compared to Microplastics at Environmental Exposure Levels’라는 논문으로 게재됐다. 김진수 박사가 책임저자, 정혜주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사가 제1저자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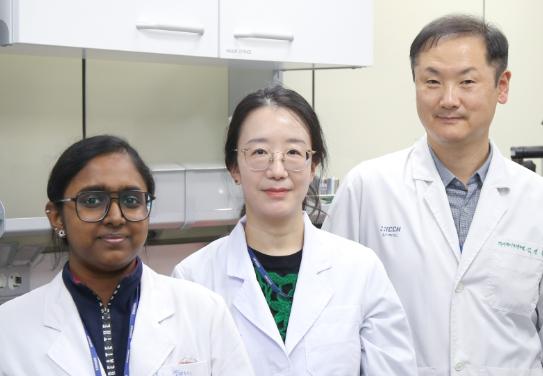 김진수(오른쪽부터), 정혜주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사팀
김진수(오른쪽부터), 정혜주 한국원자력의학원 박사팀
김진수 박사는 “현재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미세·나노플라스틱은 관리 체계가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다양한 플라스틱 입자 조합, 실제 환경 시료, 인체 역학 연구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공기 중 미세·나노플라스틱 관리 기준 마련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고유사업으로 진행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운영 및 응용연구’와 한국연구재단 우수연구·중견연구사업(유형1)으로 진행한 ‘미세플라스틱 흡입과 폐암 발생 가능성: 입자 크기와의 상관성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