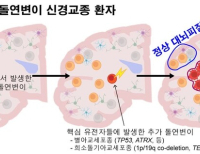저항성 고혈압(resistant hypertension, 또는 refractory hypertension, RH, RHTN)은 이뇨제를 포함해 서로 다른 계열의 최소 3가지 항고혈압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모든 제제를 최대 또는 최대 허용 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목표 혈압’ 이상으로 유지되는 고혈압으로 정의된다. 또는 혈압 조절에 4가지 이상의 항고혈압제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치료 목표 혈압은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 심장학회는 2017년에, 한국 관련 학회는 2022년에 고혈압 진단기준을 기존 140/90mmHg(수축기/이완기 혈압)에서 130/80mmHg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난치성’인 저항성 고혈압이란 특성상 치료 목표를 기존의 140/90mmHg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130/80mmHg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도 상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3가지 고혈압 약제는 이뇨제, 안지오텐신수용체 차단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또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I), 칼슘채널차단제(calcium channel blocker, CCB)로 구성된다. 4가지 고혈압 약제로는 일반적으로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mineral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 MRA)가 추가된다.
진단과 분류
저항성 고혈압의 진단은 명백한 예외 조건을 배제해야 한다. 저항성 고혈압으로 오진하게 하는 3가지 주요 원인은 약물 비순응(낮은 약물 순응도), 백의 고혈압(White Coat Hypertension), 부적절한 혈압 측정 기술 등이다.
여기서 진짜 저항성(RESISTANCE)을 ‘가짜 저항성’(PSEUDORESISTANCE) 또는 ‘외관상 저항성’(APPARENT RESISTANCE)과 구분하기도 한다. 가짜 저항성은 앞서 말한 3가지 오진 요인이 컨트롤되지 않아 최적이 아닌(suboptimal) 상태로 측정된 저항성 고혈압을 말한다.
외관상 저항성은 형식상 3가지 오진 요인을 감안(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물 순응도(적정용량 복용 여부 포함)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고, 백의 고혈압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진료실 외 측정 혈압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한 상태를 말한다.
약물 비순응(Medication nonadherence)은 치료 저항성 고혈압의 25~50%(적게는 3%, 많게는 80%, 여러 연구논문의 메타분석 결과 약 31%)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종류의 약물 복용(다약제)이 중요한 원인인데, 다기관 연구에서는 약물 수가 증가할 때마다 비순응률이 증가했다.
‘백의 고혈압’은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 앞에만 서면 긴장해서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실 측정 혈압은 높은데 진료 실 외 혈압은 목표 혈압 이하로 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진료실 혈압 140/90 mmHg 이상이면서 주간 활동성 혈압은 135/85 mmHg 미만으로 정의되는 백의 고혈압 환자는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15~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환자는 반드시 24시간 활동 혈압이나 가정 혈압을 활용해 진료실에서만 혈압이 올라가는 건 아닌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혈압은 측정 방식과 측정자의 숙련도, 혈압계의 사양에 따라 달리 측정될 수 있다. 수동식 혈압계(Aneroid sphygmomanometers)의 경우 커프(cuff) 크기가 적당해야 하고, 측정자의 청음 능력이나 손끝 말단의 압력 감지 느낌이 정확하고 일관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식 혈압계(oscillatory machines)는 수동식보다 혈압이 11 mmHg 낮게 측정된다. 수동식이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측정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자동식보다 더 자주 압력이 정확한지 교정받아야 한다. 진료실 내 자동식 혈압 측정계의 정확도는 ‘보행 중 혈압 측정’(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외관상’ 저항성 고혈압(140/90 mmHg 이상 기준) 환자의 유병률은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12.8%로 추산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 3가지 진단 배제 요건으로 걸러낸다면 ‘진정한’ 저항성 고혈압 환자의 유병률은 한 자릿수 %로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있다.
국내 고혈압 유병률은 19세 이상 성인 기준 남성은 26.9%, 여성은 약 17.0%로 추산된다. 국내 저항성 고혈압 유병률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명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체 고혈압 환자 중 12~18% 정도(중앙값 15%)가 저항성 고혈압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저항성 고혈압 유병률은 넓게 잡아도 전체 성인의 3~5% 정도일 것으로 예측된다.
저항성 고혈압 진단에서 감별돼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원발성 알도스테론증’(primary aldosteronism)이다. 이 질환은 레닌(renin)과 무관하게 부적절하고 억제할 수 없는 알도스테론이 과도하게 생성돼 고혈압과 저칼륨혈증이 유발된다. 알도스테론이 과다 분비되면 혈중 레닌 농도가 낮아진다. 이럴 경우 혈압 조절 피드백을 담당하는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RAAS)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여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혈압이 오르게 된다.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에 의한 고혈압은 주로 세포외액 부피 확장으로 인해 레닌이 감소하는 한편 환자의 부신에서 CYP11B2(알도스테론 합성효소)가 발현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 미만성 부신피질증식증, 부신피질 결절질환, 부신피질 선종, 희귀 부신피질 암종 등과 상관성을 갖는다고 제시한 바 있다.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에서 알도스테론은 관련 혈관내피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친염증 및 섬유화 촉진 효과를 나타낸다. 이 질환은 심방세동, 뇌졸중, 심근경색, 좌심실 비대 증가, 이완기 기능 장애, 대동맥 경화, 광범위한 조직 섬유증, 혈관 저항성 증가 등을 촉발해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심부전 등의 위험을 두세 배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기치료가 필요하다.
저항성 고혈압이 유발되는 이유는 일반 고혈압과 중첩되긴 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비만, 음주, 과도한 염분 섭취) △합병증(당뇨병, 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수면무호흡증, 갑상선 또는 부갑상선 질환, 쿠싱증후군(스테로이드 장기 투여), 크롬친화성세포종,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등)에 의한 2차성 고혈압(유전, 나이, 환경과 관련된 본태성 고혈압은 배제) △혈압 조절을 방해하는 약물 복용(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진통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COX-2억제제, 펜터민(Phentermine) 등 식욕억제제, 코카인 등 불법마약, 경구용 여성호르몬(피임약 포함),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혈관수축제(경구 비충혈 제거제), 각성제, 알코올, 항우울제, 감초·마황 등 일부 한약재) 등과 관련 있다.
저항성 고혈압이 더 위험한 이유
저항성 고혈압은 심부전,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신부전 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들 질환에 의해 유발 또는 악화될 수 있다.
혈압은 115/75mmHg까지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를 넘어서 수축기 혈압이 20mmHg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mmHg 이상 증가할 때마다 치명적인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한다.
저항성 고혈압 환자는 여러 합병증 가운데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가장 높다. 5년간 후향적 코호트 연구(Kaiser Permanente Study)에서 저항성 고혈압 환자 6만327명과 비저항성 고혈압 환자 41만59명을 비교한 결과 저항성 고혈압 환자는 심부전 위험이 46% 더 높았다. 말기 신장질환 위험은 32%, 허혈성 심장사건의 위험은 24%, 사망 위험은 6% 더 높았다.
20만명 이상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후향적 연구에서 저항성 고혈압 환자는 평균 3.8년의 추적기간 동안 사망,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만성신장질환(CKD) 등의 복합적인 결과를 가질 가능성이 47% 더 높았다. CKD 환자는 일반 고혈압 환자보다 저항성 고혈압의 유병률이 훨씬 높으며, CKD에 의해 초래된 저항성 고혈압 환자는 비(非) 저항성 고혈압(일반 고혈압) 환자보다 심혈관질환 및 말기 신장질환의 발병률이 현저히 높다. 당뇨병 환자의 저항성 고혈압 유병률도 높게 나타난다. 인종적으로는 흑인에서 높게 나타난다.
고식적 약물치료(표준요법)
저항성 고혈압으로 진단되면 새로운 계열의 고혈압 약물을 투여하기에 앞서 는 저항성 고혈압을 야기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나 병용약제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즉 저항성 고혈압 환자는 말단 장기 손상에 대한 선별검사부터 받아야 한다. 예컨대 신장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및 소변 검사를 실시한다. 좌심실 비대를 평가하기 위해 심전도 또는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한다. 또 고혈압성 망막병증을 확인하기 위해 안과 검사를 시행한다.
이를 보정한 후에 기존 3가지 약물의 적정성을 리뷰한다. 각각 기전이 다른 세 가지 약물을 최대 내약 용량으로 사용하는 게 기본이다. 이어 추가할 4번째 약제를 선택한다.
가장 기초가 되는 이뇨제로는 치아자이드(thiazide) 계열 약물 중 작용시간이 긴 클로르탈리돈(chlorthalidone)이나 인다파미드(indapamide)를 고려해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혈압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이뇨제로 클로르탈리돈을 권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이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hydrochlorothiazide, HCTZ)가 훨씬 많이 처방된다.
클로르탈리돈은 체내에서 더 오래 지속되지만 신장 및 전해질 이상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구체여과율이 어느 정도 보존된 환자(정상치에 가까운, 정상치는 90~120mL/분/1.73m²)에 한해 장시간형 치아자이드 계열 이뇨제를 써야 한다. 원칙은 그렇지만 클로로탈리돈은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 15~30mL/분/1.73m²인 환자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 30mL/분/1.73m² 미만인 환자에게는 고리형 이뇨제(Loop diuretic)가 선호된다. 토르세미드(Torsemide)는 하루 한 번 사용할 수 있지만, 푸로세미드(furosemide)나 부메타니드(bumetanide) 같이 작용시간이 짧은 루프 이뇨제는 하루 두 번 이상 복용해야 한다.
환자의 동반질환에 따라 1차 우선 치료제가 달라질 수 있다. 심부전, 심근경색, 대동맥박리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베타차단제metoprololsuccinate, bisoprolol)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 베타차단제로 충분하지 않으면 알파1 수용체도 함께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베타차단제(labetalol, carvedilol)를 추가한다.
단백뇨가 있는 환자에게는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시스템(Renin-Angiotensin-Aldosterone System, RAAS)을 차단하는 약물(ACEI나 ARB)이 1차 치료제로 추천된다.
ACE 억제제 또는 ARB 가운데 ARB는 혈관 부종이나 기침 위험이 ACE 억제제보다 낮기 때문에 내약성이 더 좋다. 대체로 ACE 억제제보다 초기 치료제로 ARB가 권장된다.
칼슘채널차단제(주로 long-acting dihydropyridine 계열)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관 경직에 효과적이다. 특히 노인의 수축기 고혈압에 효과가 좋고, 혈관보호·심박수 조절·뇌졸중 예방 효과를 겸비하기에 많이 처방된다.
일반적으로 저항성 고혈압의 3제 요법은 이뇨제, ARB/ACEI, 칼슘채널차단제로 구성된다.
세 가지 약물을 최대 내약 용량으로 투여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mineral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 MRA)를 가장 먼저 4차 치료제 중 하나로 고려하게 된다. 스피로노락톤(spironolactone) 또는 에플레레논(eplerenone) 등이 이에 해당한다.
PATHWAY-2 연구에 따르면 이들 3제 요법 혈압약을 복용하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 스피로노락톤이 베탄차단제인 비소프롤롤(bisoprolol), 알파-1 교감신경차단제인 독사조신(doxazosin)과 비교해 혈압 강하 효과가 더 우수했다.
스피로노락톤의 부작용으로는 고칼륨혈증(신장기능 악화)과 성호르몬 교란에 의한 여성형 유방과 무월경 등이 있다. 따라서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여성형 유방이 극심한 경우에는 성호르몬 스테로이드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적 알도스테론 수용체 길항제인 에플레레논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스피로노락톤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었고, 비용이 저렴하며, 에플레레논보다 반감기가 길어 매일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선호된다.
MRA 제제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5차 치료제로 혈관확장성 베타차단제인 메타프롤롤(metoprolol), 비소프롤롤 라베탈롤(labetalol), 카르베딜롤(carvedilol), 네비볼롤(nebivolol) 등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심박 수가 분당 70회 미만이거나 베타차단제 금기인 환자의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알파-2 작용제인 클로니딘(clonidine)이나 구안파신(guanfacine)을 사용한다. 클로니딘은 경피 패치제 제형으로 순응도를 높이고, 경구 투여 횟수를 줄이며, 반동성 고혈압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들 알파-2 작용제는 고혈압은 물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사용된다. 특별한 경우 강박장애(OCD)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에 오프라벨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심장협회(AH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혈압이 이런 치료들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심박출률 감소를 동반한 심부전이 있는 경우 히드랄라진(hydralazine) 25mg을 하루에 3회, 초기 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다. 이 때 질산염 제제를 추가할 수 있다.
히드랄라진에 내약성이 없는 경우 미녹시딜(minoxidil)을 사용할 수 있다. 히드랄라진과 미녹시딜은 체액 저류 및 반사성 빈맥과 관련이 있는 저항성 고혈압을 겨냥한다.
이밖에 MRA 제제로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는 비-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칼슘채널차단제인 딜티아젬(diltiazem)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요법이 추천될 수 있다. 딜티아젬은 일반적인 디히드로피리딘 계열 CCB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시간형, 속효성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채택된다. 심실 박동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외에 협심증, 부정맥(심방세동, 심방조동) 등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항성 고혈압의 치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게 된다.
박성하·이찬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팀은 2025년 5월, 기존 스피로노락톤으로 해결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에 칼륨보존형 이뇨제인 아밀로라이드(Amiloride)가 적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미국의사협회지’(JAMA, IF=63.1)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국내 1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저항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118명을 대상으로 칼륨 보전 이뇨제 중 하나이지만 스피로노락톤보다 부작용이 더 적은 것으로 알려진 아밀로라이드의 혈압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자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118명 중 58명은 아밀로라이드 치료 그룹으로, 60명은 스피로노락톤 치료 그룹으로 배정됐으며, 총 12주간 약제를 복용한 후 평균 가정 수축기 혈압과 진료실 목표혈압 달성률 등을 측정했다. 등록 당시 아밀로이드 그룹과 스피로놀락톤 그룹 간 특징 차이는 없었다. 등록 당시 아밀로이드 그룹의 평균 가정 수축기 혈압은 141.5mmHg였으며, 스피로놀락톤 그룹은 142.3mmHg였다.
분석 결과 등록 당시 대비 12주차 평균 가정 수축기 혈압은 아밀로이드 그룹은 14.7mmHg, 스피로노락톤 그룹은 13.6mmH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간 혈압 감소의 차이는 –0.68mmH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아밀로라이드의 비열등성을 확인했다. 12주차 가정혈압 변화도 수축기혈압 또는 이완기혈압 모두 두 그룹에서 잘 조절됐고, 두 그룹 간 혈압 변화량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 가정 수축기 혈압 130mmHg 달성률은 아밀로이드 그룹이 66.1%, 스피로노락톤 그룹은 55.2%였고, 진료실 수축기 혈압 130mmHg 달성률은 아밀로이드 그룹이 57.1%, 스피로노락톤 그룹 60.3%로 각 영역에서 모두 두 그룹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약물 부작용 발생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박성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 아밀로라이드가 스피로노락톤과 비교해 수축기 혈압 감소효과와 목표 혈압 달성률 등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부작용 등으로 인해 4번째 항고혈압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던 환자들에게 혈압 조절을 위한 치료 선택지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화약품은 프랑스 퀀텀지노믹스(Quantum Genomics)와 저항성 고혈압 치료제 ‘피리바스타트(Firibastat)’의 한국 내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독점 라이선스 도입 계약을 2021년 4월에 체결했다.
피리바스타트는 뇌 아미노펩티다아제 A 억제제(Brain Aminopeptidase A inhibitor, BAPAI) 계열의 신약후보물질로 뇌의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Brain Renin Angiotensin System, bRAS)의 안지오텐신 Ⅲ의 생성을 억제해 혈압강하, 이뇨작용, 심박동 조절의 삼중작용을 하는 저항성 고혈압 및 심부전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3상을 진행 중인데 긍정적인 중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